경계를 넘는 작가들

1호
한인 디아스포라문단의 선구자 -조명희 작가의 삶과 문학
이명재
작가 조명희(趙明熙, 호는 抱石, 1894∼1938)의 삶과 문학사적인 업적을 새롭게 새겨본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유학 도중 귀국한 자신이 문단을 개혁하고, 소련 망명지에서 고려인 한글 문단을 키운 그의 생애는 남다르다. 그 성과는 현재 한반도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한인들이 세계 여러 곳의 코리아타운에서 연 디아스포라 문단과도 연결된다.
조명희는 구한말에 충북 진천에서 사대부 집안의 6남매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시골에서 서당과 성공회당 등에서 신구문물을 익히기 시작한다. 26세에 3·1만세운동에 가담한 그는 고향을 떠나 일본 동양대학에서 고학한다. 희곡 「김영일의 사」 등을 써서 김우진 등과 극예술동우회의 국내 순회공연도 펼친다.
1923년에 귀국한 그는 고향에서 낭만적인 시집 『봄 잔디밭 위에』(1924)를 펴낸 후에 문학 노선을 바꾼다. 1925년 카프 창립에 나서고 자전적인 단편 「땅속으로」 등으로 식민 통치를 매섭게 고발한다. 잇따라 계급투쟁 작품을 발표한 그는 이념에 깊어진 창작집 『낙동강』(1928)을 출판한 후에 러시아 연해주로 망명한다. 그곳의 《선봉》 신문에 「짓밟힌 고려」 등의 항일 시 발표로 큰 반향을 일으킨다.
작가는 신한촌과 육성촌에서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한글 문학도 지도한다. 사회주의와 한국민의 정체성을 불어넣는다. 1934년 소련작가동맹에 가입하고 그곳 사범대학에서 강의도 맡는다. 그리고 《선봉》에 ‘문예란’ 신설을 주선한 그는 고려인 공동작품집 『로력자의 고향』(1934), 『로력자의 조국』(1937)에 작품 총평을 싣는다. 그러나 그 책에 광고된 “조명희 작, 시-산문집 『두 얼굴의 쪼각 그림』”은 햇빛을 못 본다. 식구들이 스탈린에 의해 먼 대륙으로 끌려가기 전에 그는 일본의 첩자라는 죄목으로 갇힌 채 이듬해에 하바롭스크 감옥에서 처형된다.
그래도 현역 작가로서는 처음인 그가 연해주에서 키워낸 문인들의 한글 작품은 1937년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제자들이 끈질긴 고려인 문단을 이룬다. 낯선 땅에서 《레닌기치》에 발표하고 개인 시집과 공동 작품집 등을 출간한다. 강태수, 김광현, 김기철, 김세일, 김준, 연성룡, 전동혁, 조기천, 태장춘 등의 작품들이 중앙아시아에서 꽃피고 열매를 맺는다. 조기천 시인 등은 조국 광복 후에 평양에 들어와 북한문학을 소비에트화하였다.
동북아시아에서 조명희 작가로부터 시작된 한인들의 디아스포라적인 한글 문단은 세계로 번져나간다. 일찍이 간도로 이주한 조선족 한글 문학과는 달리 한국 휴전 이후 자유이민으로 나간 우리 문단은 여러 도시 곳곳에 뻗어간다. 북미 지역의 《캐나다문학》, 《미주문학》 등은 모국에 버금간다. 남미의 브라질에는 《열대문화》, 아르헨티나에는 《로스안데스문학》이 연간으로 출간된다. 한글 문예지가 여럿인 호주 시드니는 물론 근래 동남아의 자카르타에도 생겼다. 유럽에는 초청 노동자로 나간 간호사나 광부 출신 중심의 《베를린문향》, 《독일한국문학》이 있다. 교민에 의한 《유럽한인문학》 외로 요즘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선 《도나우담소》도 나온다.
한평생 일제와 소련의 통치 밑에서 모국어로 작품을 쓰며 문인을 키워온 조명희(趙明熙). ㅡ조국을 떠나 일본 고학과 귀향 이후 서울을 거쳐 연해주 망명 중 숨진 그의 45년 생애는 변증법적 삶을 산 민족 작가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오늘에도 한글을 통해서 세계로 이끈 디아스포라문학의 선구자로 떠오른다.

현 중앙대 명예교수이자 하와이대와 러시아 극동대 초빙교수로 재직한 바가 있다. 197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문학 평론가로 등단하였으며 2011년 한국소설 신인상에 당선되었다. 평론가국제한인문학회 회장, 세계 한글작가대회 집행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세계문학 넘어서기』 등 평론집 7권을 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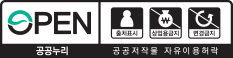
출처를 표시하시면 비상업적·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도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