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스포라 깊이읽기

7호
사진 신부
평론: 정은귀
텐트 모양 치마를 입은 할머니, 발 없이 걸어온 엄마
정은귀(번역가, 한국외대 교수)
캐시 송(Cathy Song, 1955-)은 한국계 미국 시인들 중 정전 대열에 가장 먼저 들어선 시인으로 하와이 태생의 한인 이민 3세대 시인이다. 캐시 송의 첫 시집 『사진 신부(Picture Bride)』(1982)는 출간되자마자 ‘예일 젊은 시인상(Yale Series of Younger Poets Prize)’을 받았고 그해 ‘전미 도서 비평가 협회상(National Book Critics Circle Award)’ 후보로도 거론되었다. 최근 김혜순 시인이 한국 작가로서는 최초로 수상한 상의 후보로 42년 전에 거론된 셈이다. 첫 작품으로 성공적인 데뷔를 한 후 캐시 송은 두 번째 시집, 『창틀 없는 창문, 네모난 빛(Frameless Windows, Squares of Light)』(1988), 그리고 『스쿨 피겨(School Figures)』(1994), 『은총의 땅(The Land of Bliss)』(2001), 『손을 움직이는 구름(Cloud Moving Hands)』(2007) 등을 연달아 펴내고, 여러 해 전에는 단편 모음집 『세상의 그 모든 사랑(All the Love in the World)』(2020)을 내기도 했다. 캐시 송은 디아스포라 여성 주체의 경험과 가족 이야기를 시의 소재로 삼아 조용하지만 들끓는 이민자들 내면의 갈등과 목소리를 실감 나게 보여준다.
첫 시집을 대표하는 시 「사진 신부」가 『노턴 미국 문학 선집(Norton Anthology of American Literature)』을 비롯해 여러 선집에 실림으로써 캐시 송은 한국계 미국 이민자들의 경험을 내밀히 보여준 첫 시인으로 자주 거론된다. 캐시 송이 시집 출간을 위해 그간 써둔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을 때 시인은 다른 제목을 염두에 두었는데, 시인이 시적 영감을 받은 미국의 화가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의 그림에서 빌려 온 “하얀 장소에서(From the White Place)”다. 하지만 편집자가 ‘사진 신부’라는 제목을 권했고 시인은 그를 받아들였다. 시집의 첫 시, 「사진 신부(“Picture Bride”)」는 캐시 송이 시를 쓰던 당시보다 한 살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태평양을 가로질러 하와이에 도착했던 어린 신부, 할머니의 젊은 날을 그린다.
“
한국을 떠날 때 스물 셋.
그녀, 아버지의 집 대문을
담담히 닫고
걸어 나갔을까.
(……)
그 섬 기슭엔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지
그녀의 사진을
불빛에 비춰보며
(……)
그 남자의 방 안은
사탕수수 줄기에서 날아온
나방들의 날개로
환해지고 있었겠지?
내 할머니는 어떤 물건들을
지니고 가셨을까? 또
그 곳에 도착해서
자기보다 열세 살 많은,
남편 될 낯선 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게 되었을 때
그녀, 다소곳이 풀었을까,
한복 저고리 비단 옷고름을,
텐트모양 치마를,
남자들이 사탕수수 줄기를 태우던
주변 들판에서 불어온
마른 바람으로 부풀어 오른 그 치마를?
―「사진 신부」 중에서
”
배가 기다리고 있는 부산의 항구로 가는 스물셋 새 신부가 될 이의 모습을 그리는 첫 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고향 집에서 항구로, 다시 이름도 모르는 낯선 섬으로 가는 긴 여정이다. “아버지의 집 대문을/ 담담히 닫고/ 걸어 나갔을까.”라는 질문을 물음표가 아닌 마침표로 처리하면서 시인은 눈물을 꾹 참으며 먼 길 떠날 어린 신부의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에 여운과 결심을 새긴다. 먼바다를 건너 도착한 항구에는 사진으로 보았던 젊은 청년이 아니라 늙은 남자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 당시 사진 자료를 찾아보면 혼례식 장면에서 태평양을 건너온 앳된 신부 옆에 늙수그레한 남자가 서 있다. 도저히 신랑으로 생각되지 않게 나이 차가 나는 모습이다. 실제 나이 차이도 있겠지만 이산의 낯선 땅에서 사탕수수 농장의 고된 노동을 반복하다가 남자는 일찍 늙어버렸다. 시에서 시인은 주름진 얼굴의 남자를 새신랑으로 맞이하고 살아갈 어린 신부의 당혹스러운 신혼 첫 밤을 상상하면서 자신의 할머니가 젊은 날 입었던 한복을 “텐트모양 치마(tent-shaped dress)”라 표현한다. 이는 한국의 문화를 잘 알지 못하는 이민 3세대의 시선이 투명하게 언어화된 구절로 흥미롭게 읽힌다. 시집의 두 번째 시 「막내딸(“The Youngest Daughter”)」은 늙은 엄마를 돌보는 막내딸의 이야기다. 옹기종기, 도란도란, 시끌벅적, 어린아이들이 장성하여 대도시로 떠나고, 이제 집에 남은 사람은 둘이다. 병든 엄마와 막내딸.
“
하늘은 여러 해 동안
어두웠다.
내 피부는 라이스페이퍼처럼
창백하고 눅눅해졌다
저 바깥 들판에서 따가운 햇살에
바싹 말라붙기 전에
엄마 피부가 딱 그랬을 것 같다.
(……)
30년째 인슐린을 맞은
몸에 생긴 반점들,
그 시퍼런 멍에 손길이 닿을 때
나, 마음 약해질 뻔했다.
나는 엄마를 천천히 비누칠해 드렸고
엄마는 눈을 감은 채 깊은 한숨을 쉬셨다.
늘 이래왔던 것 같아.
우리 둘이서
빛도 안 드는 이 방에서
찰방찰방 목욕물 끼얹으며.
오후엔
엄마가 휴식을 취하시고
우리만의 의식으로 차와 밥을 준비하신다.
얇게 저민 생강 곁들인 생선 한 토막에
내 하얀 몸의 표식 같은
절인 순무 한 조각 곁들여서.
익숙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밥을 먹는다.
지금도 도망칠 궁리를 하는 나,
나를 온전히 믿을 수 없다는 걸 엄마는
아신다. 엄마가 따라주신 차로
나는 엄마 건강을 위해 건배하고,
창문에 드리운 천 마리 학 커튼이
갑작스런 미풍에 하늘로 날아오른다.
―「막내딸」 중에서
”
당뇨를 오래 앓으신 어머니. 집에 홀로 남은 막내딸은 방에 목욕탕을 들여 엄마를 씻기며 엄마 몸의 푸른 멍을 바라본다. 빛도 안 드는 방은 여러 해, 별 희망도 즐거움도 기대도 없이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두 여자의 삶, 감옥에서 시들어가는 수인(囚人)의 삶 같은 날들을 잘 보여준다. 목욕을 마치고 엄마와 딸은 함께 밥을 먹는다. 익숙한 침묵 속에서 딸은 매일 탈출을 꿈꾼다. 엄마를 떠나 자유를 찾아가는 상상. 창문으로 수천 마리 학이 날아가는 상상과 그런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시선이 절묘하고 아프다. 그 딸은 탈출에 성공했을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딸들이 돌봄 노동 속에서 빛도 안 드는 방에 갇힌 사람처럼 그렇게 시들어가고 있는지…….
또 다른 시 「차이나타운(“Chinatown”)」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캐시 송은 어머니가 중국인이다. 캐시 송의 할아버지 송석순은 열여덟 살 나이에 하와이로 건너가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고 할머니 전복필은 그보다 18년 뒤, 스물셋 나이에 사진 신부가 되어 자기보다 열세 살 많은 남자와 결혼하게 된다. 조부모님이 이민 첫 세대의 온갖 고생을 다 감내하며 끝에 미국 사회에서 건실하게 뿌리 내렸고, 그 다섯 번째 아들이 캐시 송의 아버지다. 아버지는 항공기 조종사로 일했고, 어머니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재봉사였다. 그런 가계의 역사가 시에 녹아 있는데, 다음 시 「차이나타운」은 미국에서 디아스포라의 신산한 삶에 대한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한다.
“
차이나타운들: 다들 똑같아 보여.
도시의
심장에서. 죽어있는
중심: 붉은 빛과
게토 사이에서 깜박이는
물고기 눈들,
너저분한 영화관들과
번지르르한 오락실들.
얼기설기 누릿한 종양들,
파르르 떠는 곤충 날개들.
랜턴 같은 나방들과
다른 수상한 인물들:
백열전구와 밤에 부화하는
바퀴벌레 알들.
(……)
엄마는 다시 부풀었다.
물에 잠긴 듯 부어 있고.
시큼한 자두들이
눅눅한 지하창고에서 삭아가고.
엄마는 그 아이들
공기를 쐬게 하시네.
차처럼 한 모금씩 마셔봐.
―「차이나타운」 중에서
”
“도시의 심장에서. 죽어 있는 중심”은 게토처럼 대도시의 중심에 자리 잡은 채, 현란한 꽃처럼 피어나는 이민자들의 공간을 선명하게 그린다. 그 공간은 누릿한 종양처럼 엄청난 생명력으로 그 도시를 빠르게 점령하고 먹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먼 땅에서 떠나온 사람들이 서로 기대어 살아갈 것이다. 마작을 하는 할머니, 재봉사로 일하는 어머니가 대나무 젓가락처럼 얼기설기 이은 집에서 아이들을 기른다. 시의 뒷부분에 “아이들은 떠있는 만두들/ 김 무럭무럭 솥에서/ 수면에 까닥까닥 떠 있는/ 작은 보트들”이란 말로 자라나는 디아스포라 뒷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준다. 든든한 땅에 굳건히 뿌리내리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솥에서 떠다니는 만두처럼 부유하는 존재들이지만, 시인은 익숙한 듯 낯선 문화적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민자 서사를 시로 완성한다.
다음 시 「잃어버린 언니(“Lost Sister”)」는 중국에서 건너온 시인의 어머니의 삶에 투영된다. 중국에서 첫딸은 ‘옥(jade)’으로 불렸다는 이야기로 시작하며 시인은 중국의 전족 관습에 매여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는 여성들의 삶을 이야기한다.
“
바다 건너
언니 하나 있어,
이름을 포기한 언니,
푸른 옥을
태평양 푸른 파도에 씻어내며.
메뚜기 무리들과 함께 일어나
언니는 다른 해변을 적시려고
다른 이들과 떼지어 다녔지.
미국에는
많은 길이 있어서
여자들도 남자들과 활보할 수 있지.
하지만 또다른 황야에선
그 가능성,
그 외로움이
정글 덩굴마냥 목을 조를 수 있어.
변변히 않은 음식과 한때
내 것이었던 감상들―
발효된 뿌리, 마작 패와 폭죽들―
밤이 없는 도시의 숲에서
변변찮은 살림이 되네.
거대한 뱀이 위에서 덜컹거리며
당신 주방에 검은 구름을 뿜고.
핏기 없이 푸석푸석한 얼굴의 주인은
당신 열쇠 구멍으로 들락날락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생떼를 쓰고
세탁소들 그리고 체인 레스토랑에서
당신의 대화 창구를 훔쳐 듣고.
―「잃어버린 언니」 중에서
”
걷는 것이 사치였기에 “대신 딸들은 찻잔 크기의 신발을 신고/ 걷는 법을 익히며/ 인내를 끌어” 모은다. 그 딸들이 바다를 건넌다. 바다를 건너며 가문이 준 이름을 포기한 대신, 맏딸은 발을 얻는다. 남자들처럼 길 위를 활보할 수 있는 자유를. 미국이란 낯선 땅은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 한 자유와 가능성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외로움의 공간이기도 하다. 밤이 없는 도시의 삶. 거대한 뱀이 지나듯 덜컹이는 전차 소리를 들으며 이름을 버린 맏딸은 핏기 없는 얼굴로 살아간다. 도시의 한구석에서 살아가는 그녀의 뿌리를 유일하게 보여주는 것은 팔에 찬 옥팔찌다.
시는 디아스포라 여성 주체의 서러움과 당당함, 그 고단하면서도 힘찬 여정을 보여주는 구절로 끝난다. “당신은 엄마를 기억하지요./ 여러 세기 동안 걸어온 엄마./ 발도 없이―/ 그리고 엄마처럼,/ 당신도 지문을 남기지 않았지요,/ 그 사이에/ 대양이 있었기에,/ 당신 반역의 끝없는 공간.” 디아스포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반역’의 삶을 사는 일이다. 자신을 배태한 땅, 안전한 땅, 가만히 있으면 속박된 삶이기는 하지만 보호를 받는 곳, 안정을 저버리고 뿌리를 지우고 떠나는 길이라서 디아스포라 주체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고달프다. 특히 20세기 초기에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여성 주체는 자신의 이름을 가문의 역사에서 지우고 삶의 방식까지 송두리째 바꾸는 모험을 감행해야 한다. 그 서럽고도 고단한 길을 시인은 발도 없이, 지문도 없이 걷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일이 년이 아니라 여러 세기 동안 걸어온 엄마. 잃어버린 언니는 모든 디아스포라 여성 주체를 상징하고, 그래서 그 발 없는 걸음은 수백 년을 이어 계속되는 것이다.
시집의 마지막 시 「재봉사(“The Seamstress”)」는 캐시 송의 어머니를 그린다. 시집 전체가 한국인 이민자로 산 조부모님, 그리고 이민 2세대로 각각 한국계, 중국계 미국인이었던 부모님의 삶이 어리고, 동시에 이민 3세대로써 시인으로 발돋움하려는 캐시 송 자신의 이야기가 다채롭게 엮여 있다.
“
내 눈은 오늘도 또 따갑다.
한 언니가 근처에서 양파를
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매들은 집에서 저마다 신중해서
밥 먹으며 얘기할 때도 서로 공손하다.
나는 이 불규칙한 방에서
늘 살았던 것 같아. 깔끔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 직선의 솔기들과 내 마음에 단단히 고정되는
그 똑딱단추들 너머를 볼 필요는 못 느끼고.
나는 지금 내 손 아래에 있다.
세상이 얼마나 그대로인지
그래도 나는 놀라지 않아.
아버지는 녹색 호스를 들고
잔디를 가로질러 가시고, 아버지
어깨 아래로 물 리본이 똑똑 떨어져
헐렁한 회색 셔츠 왼쪽 주머니에
얼룩이 생기네.
하얗고 먼지 많은 여름의 그 결혼식 드레스들.
한때 매우 조용한 누군가가 여기에 살았다.
―「재봉사」 중에서
”
하루 종일 바람도 잘 들지 않는 작은 방에서 재봉틀 앞에 있는 엄마. 재봉사 엄마는 아마도 수많은 젊은 신부들의 혼인예복을 만들고 있을 것이다. 매일 고개를 수그리고 손과 발의 정확한 리듬 안에서 완성되는 일상들, 완성되는 혼인예복. 시집 마지막에 “한때 매우 조용한 누군가가 여기에 살았다”는 말로 시인은 재봉사 엄마에 바치는 시를 완성하는데, 그 구절은 시집의 표지에 동그란 거울 속, 하얀 한복을 입은 할머니의 사진과 고스란히 겹치고, 다시 시집의 첫 시 「사진 신부」 속 텐트 모양의 치마를 입은 어린 신부와 겹친다. 텐트 모양 치마를 입은 젊은 날 할머니, 수백 년 이어진 전족의 전통을 배반하고 용감하게 발 없는 걸음을 걸은 엄마, 그렇게 캐시 송은 이민 3세대로서 이민 1세대와 2세대의 이야기를 그린다. 서럽지만 서럽지 않은 이야기고, 슬프지만 슬프지 않은 용감한 모험 서사다. 캐시 송의 첫 시집 『사진 신부』는 지금도 먼 땅에서 이 땅으로, 이 땅에서 다른 땅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건너는 수많은 사연과 이어지기에 그때-그곳과 지금-여기 수많은 이름 없는 디아스포라 주체들의 생생한 재현이다. 발도 없이 지문도 없이 살아가는 고요한 존재들의 목소리를 여기서 다시 듣는 일이 그만큼 소중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 번역가. 시를 통과한 느낌과 사유를 나누기 위해 매일 쓰고 매일 걷는다. 때로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것과 시가 그 말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공부 길을 걷는 중이다. 산문집 『나를 기쁘게 하는 색깔』(2023), 『다시 시작하는 경이로운 순간들』(2023), 『딸기 따러 가자』(2022), 『바람이 부는 시간』(2019)이 있고, 루이즈 글릭의 시집 열세 권, 앤 섹스턴과 윌리엄 칼로스 윌리엄스의 시를 번역했고, 강은교, 이성복, 심보선 시인의 시를 영역하는 등 서른 권이 넘는 번역 시집을 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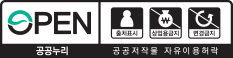
출처를 표시하시면 비상업적·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도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