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호
양수에서 부른 노래 외 1편
전은주
양수에서 부른 노래
1. 시린 강(凉水)
서울 근교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양수(两水)가 있어
두 물끼리 어우러져
한강이 되어 흐른다는데,
한여름에도 발이 시린
내 고향 양수(凉水)가 그리우면
전철을 타고
양수역에 내린다.
고향의 그 샛강은
두만강과 만나기 전
뭐가 그리 서러워
시린 울음 펑펑 솟아
양수가 되었을까?
2.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는
양수에서 자주 그물질을 했다.
새벽에도 잡아오던
펄펄 뛰는
버들치, 돌종개, 모새미치.
하루 종일 그 강에서
물살과 어울려 놀았다.
왼쪽 다리를 절던 아버지도
강물 속에서는
다리를 절지 않았다.
3. 잠
양수(两水)를 다녀 온
그런 날에는
양수(凉水) 꿈을 꾼다.
문어귀에 앉아
강으로 간 아버지를 기다리며
저물어가는 골목길을 바라보는데
아아, 화들짝 잠 깨어
내 이부자리에
잠든 채 버려진
빈 집을 본다.
외삼촌 부음
한쪽 눈이 멀었어도
송이버섯 철이면
감발하고 깊은 산으로 가
며칠 지나지 않아
버섯 한 짐 지고 나타난다.
이 품삯으로 언제 새 집 짓겠냐?
그해 겨울 낡은 행장을 꾸려
한국 거기, 가리봉동 어디쯤
겨울에도 늘 따스한
그런 집을 꼭 짓겠다며
돈 벌러 떠나갔다.
그 삼 년, 김포 어디쯤
반지하 작은 골방에서
밤낮 낯선 곳으로 떠나는
비행기들의 비명에 잠 못 이루며
빈속을 독주로 적시고는
야밤에 문득 전화를 걸어
흘러간 노래만 불렀다.
왜 친구 하나 못 사귀었소?
애꾸한테 뉘 마음 열겠니?
폭설로 잠겼던 공항이 열린
그날, 연길로 돌아왔다.
고흐의 누런 벌판보다 더 누런
황달로 야위고 꼬부라진
까만 대못으로 돌아왔다.
한국 거기, 그 어디에도
집 지을 데가 없더란다.
다시 송이꾼이 된 외삼촌은
애 딸린 여자와 결혼하고도
노을이 얼굴을 물들이면
흘러간 노래만 불렀단다.
그날 자정 너머
꿈결로 불쑥 전화가 왔는데
일찍 취해 잠자리에 든 외삼촌이
한밤에 악몽처럼 일어섰다가
장승처럼 덜컥 쓰러졌단다.
어데 집을 지어 뉘랑 사시려오?

전은주, 연세대학교 글쓰기 강사로 재직 중이며 재한동포문인협회 부회장과 재한동포시치료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다.
연변대학교, 숭실대학교 석사학위와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8년 『창작21』 신인상으로 등단하였으며 2021년 연변 시향만리 신인상, 2020년 동포문학 시부문 최우수상, 2021년 혜산 박두진 문학상 아시아시선상을 수상하였다.
* 사진제공_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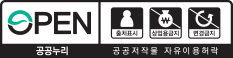
출처를 표시하시면 비상업적·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도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