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호
바람의 이름으로 외 1편
마종기
바람의 이름으로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내 나라에서 쫓겨났었다.
다시는 고국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매 맞으며 각서에 이름까지 썼었다.
그 일도 벌써 60년이 되어온다.
군의관이었던 신나게 젊었던 시절
혁대도 계급장도 구두끈도 다 빼앗기고
헌병 앞에서 수갑 차고 포승에 묶여
쓰레기같이 욕먹으며 산 어두운 감방
내가 기댈 희망의 끈은 한 줄도 없었다.
준비 없이 스산한 딴 나라에 나와서도
더부살이 회초리를 세차게 맞아가며
혀 빼고 눈감고 살기가 힘이 들었다.
들판 같은 외로움도 온몸을 할퀴었다.
그간에 고운 바람으로 네가 자랐구나.
그래, 네 말이 맞다. 최근에는
죽기 전에 국적을 회복하고 싶어
이 구청 저 주민센터에 서류 제출하고
법무부 무슨 국에는 명예를 찾겠다고
내 간절한 이유도 길게 열심히 썼었다.
(살아온 내 한 생을 믿기 힘들어하는
아들은 한국의 안과 학회에서 일간
각막 이식의 새 수술법을 소개하려고
외국인 학자로 강연 준비에 바쁜데
강연 중엔 나를 농담으로 언급한다네.)
그래 이제 나는 농담 한마디로 끝나는 몸,
그러나 아들아, 한 가지만은 믿어다오.
나는 절대로 고국에 죄짓지 않았다.
옳은 길을 가야 한다고 믿었을 뿐이다.
내 사랑이 언제나 밝기를 바랐을 뿐이다.
가거든 가슴 펴고 애비의 나라를 즐겨라.
그곳에는 고운 꽃들이 많이 핀다더라.
싱싱하고 새로운 인연도 많이 만나라.
젊은 날 내가 받았던 상처의 미친 바람들,
믿어라, 그런 회오리는 다시 오지 않는다.
해변의 디아스포라
지난밤 긴 꿈이 아침까지 남아서
해변에는 지키지 못한 약속들 흩어지고
아침은 하늘까지 올라가
맑고 따뜻한 천지를 만드는데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이가 이런 날
숨죽이며 아예 고개를 숙여버리는지
늦가을 전라도 순천만에 와서야
두 손에 묻은 비린 바람이
위로의 말을 내게 전해주네.
그 많은 억새들이 불러주는 노래가
떠도는 내 혼을 도닥여주네.
이제 기억난다. 그해에
미국 동부 뉴저지주 해변에서 만난
엉겨 모여 살던 억새도 같은 언어로
구슬피 노래하며 늪지대를 더 적시고
힘들게 산 날들을 지워버리던 날
이승의 고향에는 비가 내리고
늦가을이 가족처럼 나를 안아주었다.
같은 눈빛이라고 가볍게 웃어주었다.

1939년 일본 도쿄 출생. 1959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 연세대학교 의대,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공군 군의관 시절 재경 문인 한일회담반대 성명서에 서명하고 구금당했다. 도미 후 오하이오 주립대학 병원에서 4년간의 전문의 과정을 수료, 미국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일했다. 오하이오 의대 교수 시절 졸업식장에서 그해 최고의 교수상을 수상했다. 시집 『조용한 개선』, 『이슬의 눈』 등 다수, 산문집 『당신을 부르며 살았다』, 『우리 얼마나 함께』 등 다수를 출간했다. ‘현대문학상’, ‘대산문학상’ 등 다수를 수상했다. 2002년 미국 의사 생활 은퇴 후 연세대 의대 초빙교수, 문학의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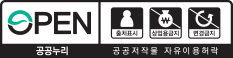
출처를 표시하시면 비상업적·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도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