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머의
새 글

1호
하늘 끝에 세 들다
유재원
가짜 바다가 속삭인다, 괜찮을 거라고, 다 잘 될 거라고. 좁게 열어둔 거실 커튼 사이로 보이는 탕다오만은 내가 칭다오에 머무는 13년 동안 진짜라고 믿었던 아주 작은 만, 바다다. 이제 칭다오를 떠날 즈음에야 문득 나는 그저 그것을 진짜라고 믿고 싶어 믿어버렸던 것임을 깨닫는다. 내 안의 진실은, 저 바다는 결코 바다가 아니다. 그것은 맞은편 내륙이 건너다보인다거나, 해변을 따라 말쑥하게 산책로와 공원을 만들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바로 내 안에 여전히 내 고향의 바다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서른 넘어 중국으로 오기 전까지 서울서 지낸 내가 ‘내 고향의 바다’를 운운하면 우스울 것이다. 하지만 이국에서 떠돌다 보면 한국 곳곳이 모두 고향이 된다. 그리고 십수 년을 살아 제2의 고향이 된 칭다오를, 여전히 천연덕스럽게 나를 다독이는 가짜 바다를 떠나 이제 다시 낯선 곳으로 가려 한다.
그간 몸담고 한국어를 가르치던 칭다오의 S대학교는 내게 너무 오래 있었다 한다. 그렇게 5년 반 동안의 ‘너무 오랜’ 인연은 참 쉽게 정리되었고, 소속 없이 홀로 칭다오에 머물기를 8개월째. 기다린다. 사실 여러 해 전부터 학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다렸고, 그렇게 중국에서 나이테를 늘려가는 사이, 한자 문학에 자꾸 마음이 갔다. 그것과 소통할 수 있다면…… 중국과 한국, 과거와 현재를 문학으로 잇는 길에 내가 할 일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만 같아 나를 품어줄 애정도 책임도 없을 이 대륙에 홀로 남기를 택했다. N대학교 문예학 박사과정 합격 통지. 먼 곳에서 긴 시간을 거쳐 내게 도착한 이 짧은 통지문은 다시 출발선이 된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 먼저 톈진까지 500킬로미터가 넘는 장거리 이사를 해야 한다. 세 식구가 십수 년 살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이 집을 혼자 정리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늦어지는 학교 일정을 마냥 기다리던 나날 끝에 드디어 간단한 짐만 꾸려 톈진행 기차에 오른다.
오른다, 기차는 칭다오에서 북쪽, 톈진으로 올라간다. 고속철로 4시간 넘게 달리는데도 한국과 달리 산 풍경을 보기 어렵다. 하염없이 이어지는 평평한 풍경이 급할 것 없다는 듯 느긋하게 나를 밀어 올린다. 이렇게 장시간 풍경의 품에서 떠밀리는 동안,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감을 느낀다. 이 기차가 지인 하나 없는 톈진에 나를 떨구면, 나는 다시 수년간 이어질 전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며칠째 낯선 도시를 걷고 또 걸으며, 혼자 살 집을 혼자 찾고 있다. 이곳 N대학교 박사과정에 입학하기 위해 반년을 넘게 마음 졸이며 우여곡절을 넘겼건만, 막상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다시 몸 둘 곳을 찾아 헤맨다. 어쩌다 도심의 뒷골목에라도 들어서면 쉽게 방향을 잃고, 어지럽게 오가는 사람들, 오토바이와 자전거들 사이에서 혼자 가만히 멈춰버리곤 한다. 표준어가 통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중국은 도시나 성을 이동하면 또 다른 나라에 발을 들이는 것과 같다. 늦은 나이에 공부를 더 하겠다며 가본 적도 없는 이곳에 원서를 낸 것이 모두 나의 뜻이었음에도, 왠지 어떤 물결에 휩쓸려 표류하다가 다시 그 물결에 떠밀려 닿게 된 곳이 여기인 듯하다. 반가울 것 없는 이방인에게 도시는 그저 심드렁할 뿐이다. 가족을 모두 한국에 두고 나는 무엇을 찾겠다고 고집스레 여기까지 밀려왔을까. 그것이 무엇이든 찾을 때까지 버티면 찾을 것이다. 26층 옥탑 원룸의 실내는 낡고 오래되어 이미 주인 없이 버려진 느낌이다. 그러나 복층 구조인 원룸 높다란 벽 대부분을 차지한 커다란 창이 나를 사로잡는다. 창밖 근거리에 고층 건물이 없어 멀리 뻗어나가던 시선은 뿌연 대기에 주춤하며 지평선을 찾지 못하고 만다. 생각해 보니 따가운 햇살 때문이 아니라도 마주한 수많은 창문을 의식하느라 커튼을 활짝 열고 산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집은 커튼을 닫을 일이 없을 것만 같다. 그래, 이 집이다!
셋에서 하나가 되어 집도 줄이고 짐도 줄이는 이사. 이삿짐을 싸는 일보다 나눠주고 버리는 일이 더 어렵다. 누구에게 주면 짐이 아니라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버려지는 것은 과연 정당한 일인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는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이곳은 아직 포장 이사 개념이 없기도 하지만, 집안 모든 물건에 대해 일일이 그 향방을 결정해야 하기에 돕겠다는 친구들을 마다하고 직접 짐을 싼다. 책들 이외에는 나눠주고 버리는 것이 반이 넘는 와중에도 꾸역꾸역 다시 품는 것들. 평생 못다 채울 이면지 같은 것들. 그걸로 뭐 하려고? 그거 해서 뭐 하려고? 모든 것을 수단으로 볼 때, 나는 쓸모없는 것을 잔뜩 끌어안고 쓸데없는 짓을 밥 먹듯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들이 그 자체로 나의 일부이고 나의 동력임을 아는 이는 별로 없는 듯하다. 그래도 괜찮다, 나를 저지할 수는 없으므로, 나는 이것들을 안고 550킬로미터를 달려 26층까지 오르고야 말 것이므로.
선수 과목인 중국고대문학 교재를 받고 나니 덜컥 겁이 난다. 나이 50이 코앞인데 젊은 혈기들을 어찌 따라가겠다고. 그러다 무작정, 글을 배우던 처음의 마음으로 필사를 시작한다. 중국어 손글씨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 참 느리다. 그래, 따라가지 말고 내 속도로 가자, 이 서툰 한자가 좋은 논문, 좋은 문장이 될 때까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때까지. 그 옛날 관료 등 고위층 사람들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일상에서 『시경』 구절을 들어 소통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는 내용을 쓰고는 또 창 앞에 선다. 근사한 풍경 대신 반듯하게 그어진 직선들. 땅이 큰 중국에서 직선은 거리에 대한 대처이자 그것이 주는 혜택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내겐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차다. 이 황량함은…… 아, 산이 없구나. 시야의 끝엔 다시 고층 건물들이 지평선을 따라 겹겹이 늘어서 하늘과 땅을 나누고 있다. 하긴 나 또한 이곳 26층 옥탑에 들어앉아 하늘 끝 경계가 되어 있으리라. 좋은 경계는 나누지 않고 이어주는 경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고국을 떠나 이중 언어 환경에서 심리적 ‘경계인’이 되어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보아왔다. 이들은 경계의 양쪽을 그 누구보다도 부드럽고 단단하게 이어줄 가능성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일까. 그 어느 옛날, 『시경』의 글자보다 『시경』의 마음으로 소통하는 관료들이 많았다면 그 시대는 분명 건강했을 것이다, 시공을 막론하고 시의 마음은 시의 마음일 것이므로. 다시 백지를 채워나간다.
26층 북동향 옥탑방, 하늘 앞에서 나는 이방인이라는 외투를 벗는다. 딱딱한 풍경 속에서 다른 조건을 대부분 포기하고 창 하나 보고 택한 집이다. 그러니 나는 저 하늘에 월세를 내는 셈이다. 창의 오른쪽 끝에서 태양이 도시의 탁한 대기를 뚫고 솟아오르더니 이내 내게 건넨 한 줄기 햇살을 거두어 다른 곳에 내어준다. 이제 태양은 더이상 나를 비추지 않을 것이다. 대신 내가 바라보는 것들을 비추리라. 그리고 햇빛 대신 품 넓은 하늘이 따갑지 않은 빛으로 내 공간을 밝혀줄 것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 나는 이곳 중국의 한 옥탑방에서 한국의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추위와 더위를 견뎌내야 할 것이다. 한밤 저 멀리 줄지어 어딘가로 향하는 가로등 불빛이 잔잔히 일렁인다. 가족과 고향, 내가 떠나 멀리 둔 겹겹의 풍경도 함께 일렁인다. 거리가 저들을 반짝이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그것은 물결이 되어 내게 닿는다. 그 물결에 나는 여기까지 올랐는지 모른다.
바다를 닮은 저 하늘, 내 창에 드리울 내일의 표정이 궁금하다.

유재원, 중국 남개대학교 문학원 문예학 전공 박사로 재학 중이다.
한중 통번역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중국 산둥과학기술대학교 한국어전공 교사로 재직하였다.
중국 대학생한국어연극대회(2016~2020년), 2018년 제20회·2021년 제23회 재외동포문학상 체험수기 부문에서 수상한 이력이 있다.
창작 희곡 「끝방」으로 2021년 가을 계간 『예술가』 예술가신인상 희곡 부문에 당선되었다.
* 사진제공_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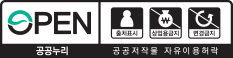
출처를 표시하시면 비상업적·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도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