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머의
새 글

3호
디아스포라 USA
임지나
오랜만에 우연히 ‘차토우 와이키키’가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온 것을 보았다.
‘어머나, 차토우 와이키키!’
차토우 와이키키는 내가 처음 미국에 오자마자 살았던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의 40층짜리 콘도미니엄이다. 1층부터 4층까지는 주차장이었고 5층은 레크레이션 데크(deck) 그리고 6층부터가 콘도였다. 우리는 그때 맨 아래층에 방 하나짜리 콘도를 4만 달러에 샀었다. 지금 매물로 나온 집이 몇 층인지는 모르나 40만 달러라면 엄청나게 오른 것 같다. 호놀룰루의 고층 콘도들은 아래층에서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마다 가격이 달라져 맨 꼭대기 펜트하우스(penthouse)에 가면은 가격이 하늘과 땅 차이로 변해 버린다.
남편과 결혼해 미국에 오기 전 혹시 미국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노라노 양재학원 강사한테서 디자인을 좀 배웠다. 디자인이라니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패턴(pattern, 옷본)’을 뜨는 것이었다. 한국은 그때 양장점에서 옷을 맞춰 입거나 아니면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기성복을 사 입던 때였다.
남편과 함께 호놀룰루에 있는 원단 가게에 갔다가 나는 패턴이란 것을 처음 보게 되었다. 대량으로 만들어져 쌓여 있는 온갖 사이즈의 패턴들. 그것은 미리 만들어 떠 놓은 ‘옷본’이었다. 나는 그 ‘옷본들’을 보고 무척 흥분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나는 그중에 제일 작은 사이즈의 패턴을 하나 고르고 천을 사다가 그 패턴대로 잘라 내 옷을 직접 만들어 보았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남편의 도움을 받고 그림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 이해가 되었다. 백화점이나 옷 가게에서 파는 옷 같지는 않았지만 그런대로 옷 모양이 됐고 입고 다닐 만도 했다. 내가 내 옷을 만들어 입다니! 흥분되고 자랑스러워 그날 밤 꼬박 잠을 설쳤다.
미국에서의 내 바느질 이력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시간이 감에 따라 점점 재봉틀에 익숙해지고 바느질에 어느 정도 자신이 생기자 나는 우리 콘도 안내판에 옷 수선 광고를 내붙였다. 심심찮게 주문이 들어왔다. 손님의 옷을 고쳐 주며 가끔 내 아이디어를 넣어 그들의 옷을 새로운 스타일로 고쳐 주기도 했다. 좀 달라진 옷을 입고 손님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며 나는 내가 패션 디자이너가 된 것 같기도 했다. 내 바느질 솜씨도 점점 프로가 되어 갔고 나도 미국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내 양장 사업의 첫 손님이 바로 하야카와 상이었다. 그녀는 나와 같은 층 복도 맨 끝에 살았다. 쉰이 넘은 듯한 중년 부인이었다. 옷 수선을 계기로 그녀는 우리 집을 자주 드나들었다. 올 때마다 묻지 않는 그녀의 신세타령을 늘어놓았고 때론 일본 음식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녀는 특히 우리 작은아이를 예뻐해 가끔 아기용 일본 기모노를 사다 주곤 했다.
하나 있는 그녀의 아들은 결혼해 따로 산다고 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아들은 죽은 남편의 아들이었다. 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일본에서 그녀의 아버지는 하야카와 상을 그때 홀아비이던 죽은 그녀의 남편과 사진결혼을 시켰다. 그녀의 애절한 삶의 스토리를 들으며 배타적이던 일본에 대한 감정이 누그러지기도 했다. 그렇게 3년을 가깝게 지내던 그녀에게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오면서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와버린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다.
미시즈 김은 호놀룰루 교회에서 만났다. 그녀의 남편 미스터 김과 우리 남편은 미8군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였다. 그녀 또한 하와이 사탕수수 밭 노동자들 사진결혼의 주인공이다. 미스터 김의 아버지가 하와이 농장 노동자로 와 시어머니와 사진결혼을 했고 아들인 미스터 김 역시 사진결혼을 했으나 전 부인이 아이 둘을 낳고 죽었다.
경상도 대구 가난한 농가 집 딸이었던 미시즈 김 역시 사진결혼으로 홀아비가 된 미스터 김에게 재취로 시집을 왔다. 그녀는 그때 신랑에게 애들이 있는 것도, 그가 아버지뻘 될 만큼 나이가 많은 것도 몰랐다고 했다. 미시즈 김은 남편인 미스터 김과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 피붙이 하나 없는 외로운 삶을 그녀는 교회 봉사에 받쳤다. 하와이는 사연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하긴 사연 없는 사람이 왜 이민을 오겠는가. 그것도 하와이 농장 이민으로.
미시즈 전은 나와 같은 이민 동창생이었다. 한국에서는 미시즈 김과 같은 동네에 살았다고 했다. 그녀는 미시즈 김의 아버지가 소작농을 살던 지주 집 딸이었단다. 미시즈 전이 호놀룰루로 온 것은 미시즈 김과의 연줄이었지만 실지로 그들은 가깝게 지내는 것 같지는 않았다. 두 사람 다 옛날 생각을 했을까. 미국처럼 평등한 사회에서 미시즈 전 역시 하녀 같던 미시즈 김의 달라진 위상이 불편했는지도 모른다.
미스터 황은 한국에서 교편생활을 하다가 국제결혼한 누이의 초청으로 미국에 온 뒤 택시 운전을 했다. 일요일 예배가 끝난 뒤 그 집 가족과 우리 집은 와이키키 비치에 피크닉을 가곤 했다. 다섯 살부터 열한 살인 그의 세 아이는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한 우리 큰아이를 서로 데리고 놀겠다고 야단이었다.
우리가 호놀룰루 생활을 접고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온 뒤 황 씨네도 LA로 이사를 했다. 나는 LA에서 부동산 면허증을 딴 뒤 레드랜즈(Redlands, LA에서 70마일 거리에 있는 인구 72,000명 정도의 대학 도시)라는 시골로 이사를 해 미국 회사에서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을 시작했다. 황 씨네는 남편이 지압 면허를 따고 LA에 주저앉는 듯했지만 2년 후 다시 하와이로 되돌아갔다. 먼저 정든 곳이 역시 고향인 모양이다. 호놀룰루에서 다시 택시 운전을 한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지 나는 이런저런 핑계로 늘 뒷북을 친다.
잭슨 씨의 부인 남순 씨도 잊을 수 없는 사람 중 하나다. 남순 씨는 한국에서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다. 그녀의 남편 잭슨 씨와 우리 남편이 같은 부서의 동료여서였다. 그때도 그녀는 내게 자신의 신세타령을 무던히 했었다. 평택인가 어디서 만난 여러 종류의 G.I들. 오랜 화류계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별 볼 일 없는 잭슨 씨를 따라온 그녀를 호놀룰루에서 다시 만났다. 남순 씨는 소위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텍사스 출신이었다. 가방끈이 짧고 걸어온 인생이 너무 험난해 늘 기가 죽었지만 그녀는 내가 만난 그 누구보다 맑고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다.
한번은 남편과 같이 저녁 초대를 받아 외출을 하게 되었다. 나는 남순 씨에게 우리 아이 셋을 맡겼다. 아이가 유난히 낯을 가려 걱정이 되었지만 그날 밤 초대는 아이를 동반할 수 없었다. 한국에서도 나와 가정부 외에는 누구한테도 가지 않던 아이라 무척 신경이 쓰였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는 목이 메도록 엄마를 부르며 보챘단다. 조막만 한 손으로 연신 문 쪽을 가리키며 엄마, 엄마 하고 울었다는 것. 세 시간 넘게 우는 우리 아이를 등에 업고 밤하늘의 무수한 별을 수도 없이 세었을 남순 씨.
남순 씨가 하와이에 정착한 2년쯤 후 잭슨 씨의 방랑벽이 또 도져 그는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렸다. 남순 씨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바에 나갔고 남편도 없이 홀몸으로 막막한 세상을 살아야 했다. 서러워 흐느끼는 그녀를 도와줄 길이 없었다. 생각해 보면 인생이란 형제도 부모도 친구도 우리에게 단 한 번의 만남이 주어지는 것을 우린 그들이 저만치 가버린 뒤 그들의 부재를 절실히 깨닫는다.
하와이에서 만난 사람들이 어찌 그들뿐이겠는가. 그곳에서 맨 처음 만나 내 외로움을 달래 준 ‘준 언니’, 건너편 콘도에 살며 3일마다 온몸의 피를 걸러 넣는 남편을 헌신적으로 보살피던 한국인 미시즈 레이니에. 공원 벤치에서 늘 우리 아이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동네 아파트의 어떤 할아버지. 우리와 같은 층에 살던 한국 아저씨와 귀여운 베트남 아가씨, 어쩌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말을 걸어보고 싶었지만 끝내 입을 떼지 못했다.
사는 동안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어찌 그들뿐이랴. 지금쯤 하야카와 상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고 사진결혼의 주인공 미시즈 김도 마찬가지다. 하와이에서 내 외로움을 달래 준 ‘준’ 언니도 사는 데 바빠 연락이 끊겼다. LA 어딘가에서 살았다는 준 언니. 얼마 전에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어느 미용사를 통해 들었다.
차토우 와이키키 콘도는 옛 모습 그대로다. 거기서 맺었던 그들과의 추억을 만나지 못한다고 잊은 것은 아니다. 와이키키 해변의 모래사장, 찬란하게 지는 노을 속에 그리운 차토우 와이키키의 얼굴들. 파도에 밀리는 모래알처럼 알알이 흩어진다.

임지나. 본명 경례 룹스만(Kyong Rae Ruebsamen). 1971년 전남대 국문과 입학, 1973년 편입하여 1974년 우석대를 졸업했다. 1975년 남편을 따라 하와이로, 1978년에는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다. 1978년 부동산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 2006년 은퇴할 때까지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했다. 2010년 《미주한국일보》 논픽션 부문에 입상, 수필가로 활동을 시작했다. 2010-2012년 미주 아카데미 그룹 회장을 역임했다. 2017년 《매일신문》 논픽션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2017년 수필집 『나 여기 가고 있다』를 출간했다. 2021년부터 미주문인협회 이사, 미주수필문학가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 사진제공_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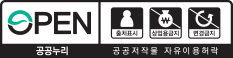
출처를 표시하시면 비상업적·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도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