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머의
새 글

3호
나는 코리안이야
김미경
“이름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네? 그럴 리가요?”
“여기 적힌 주민등록번호와 실제가 다릅니다.”
“왜 달라요? 지난해 선거 때도 투표했는데요. 다시 살펴보세요.”
한국 여권이 만기되어 영사관에 갔다. 구 여권과 새로 찍은 사진을 내밀자, 영사관 직원이 내 이름이 검색되지 않는다고 했다. 내가 말한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가 틀렸다는 것이다. 어이가 없었다. 무슨 상황인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 주민등록번호는 한번 정해지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지난 25년 동안 한국을 여러 차례 드나들었고, 여권도 몇 차례나 갱신했는데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 잘못된 번호라면 그동안 드나든 것은 허깨비였단 말인가. 그러나 내가 내민 주민등록번호로는 여전히 검색되지 않았다. 사실 증명을 위해 가족 증명서를 떼야 했다. 친정과 시집의 가족 증명서를 모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가족 증명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기가 막힌 사실이 발견되었다. 친정 엄마 이름이 ‘조모순(趙摹順)’이라는 낯선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
엄마 이름이 바뀐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엄마의 이름은 원래 조영순(趙英順)인데, 주민등록에 조막순(趙莫順)으로 되어 있었다. 엄마가 결혼하고 나중에야 그것을 알았다. 동사무소 서기가 가운데 이름자 꽃부리 영(英)을 약자로 쓰면서 없을 막(莫)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었다. 한자 이름을 우선하던 시절이었다. 이름이 잘못되었다고 엄마가 아무리 말해도 동사무소 직원은 오히려 윽박지르며 맞게 쓴 거라고 우겼다고 했다. 그 시절 행정 관청의 직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는 절대적 권위주의였다. 지금은 민원인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진 세상이지만 내가 이민 오기 전 시절에도 서류 하나 떼러 관청에 가면 주눅 든 사람처럼 직원들 눈치를 살펴야 했던 기억이 있다. 이름을 정정하는 절차가 어렵던 시절이라 결국 엄마는 서류상 조막순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살았다. 그러다 아버지가 호주로 일하러 가면서 엄마는 엄마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갖게 되었다. 아버지가 보내 주는 돈을 찾으러 외환은행에 갈 때마다 이름 때문에 창피를 당하곤 했다.
은행 창구의 직원은 “조막순 씨!” 하고 큰 소리로 부르고 나선 늘 키득키득 웃었다. 은행 안에 있던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고 킬킬킬 웃어 댔다. 성씨와 함께 부르면 연상되는 민망한 발음 때문에 사람들 시선을 끌 수밖에 없었다. 엄마는 은행만 갔다 오면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말했다. 자식이던 우리도 엄마가 놀림감이 되어 난감했을 상황은 뒷전이고 오히려 같이 웃곤 했다.
‘조막순’으로 살던 엄마는 호주로 이민을 왔다. 호주에 와서는 정작 막순이라는 이름이 독일 사람 이름처럼 들렸는지 더이상 엄마 이름으로 웃는 일은 없었다. 그렇게 영순(英順)에서 ‘막순(莫順)’으로 바뀐 이름이 이제는 ‘모순(摹順)’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어이없게도 내 이름의 한자 경(卿)도 향(鄕)으로 되어 있었다.
‘아니 이건 또 뭐람?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나는 왜 여태 이걸 모르고 있었지?’ 획 하나가 달라지면서 이름이 달라진 것이었다. 아무리 한자가 어렵다 한들 한글 이름을 확인도 하지 않고 남의 이름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마구 바꿔 놓다니. 이런 사람들이 행정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졌다.
여권을 새로 만들려면 내 신원에 대해 증명부터 하라고 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증명하라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화가 치밀어 폭발할 것 같았다. 행정관청에서 잘못한 일이면 행정 업무 보는 사람들이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영사관에 가느라 하루 일을 빼고 갔는데 일도 못 보고 시간만 허비했다. 부글거리는 속을 다스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인터넷으로 살던 곳의 구청 사이트를 찾아서 국제 전화를 하는데 한참 동안 자동 응답으로만 돌아갔다. 전화통을 붙잡고 헤매다 겨우 직원과 전화 연결을 했다. 사정을 이야기하고 지난 시절 사용했던 여권 파일과 구청장 앞으로 구구절절한 사연의 편지를 보내야 했다. 이런 경우 처리되는 기간이 꽤 오래 걸린다고 했다. 어머님이 병환 중이라서 한국에서 연락이 오면 급히 가야 해서 마음은 더 조급해졌다. 다행히 일주일 후에 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정정되었다는 메일을 받았다.
행정의 실수로 잘못된 것이니 당연히 사과의 말도 있어야 할 텐데 그런 문구는 어디에도 없었다.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처리해 준 것을 내가 고마워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 영사관에 가서 다시 신청하고 한 달 뒤에 새 여권을 찾아왔다. 엄마의 이름 정정하는 것은 아직 시도하지도 못했다. 엄마는 한국을 떠난 지 35년이 되었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일도 없다. 한국에 어떤 이름으로 남아 있든 문제 될 것은 아니라지만, 내 서류에는 엄마의 이름이 계속 낯선 이름으로 남아 있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나도 호주에 산 지 어느새 25년이 넘었다. 아직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고 영주권자로 남아 있다. 시민권을 신청하면 국적이 바뀐다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주저하고 있다. 한국 선거 때면 빠짐없이 재외 국민 투표를 한다. 친정 식구들도 다 호주에 살고 있다. 몇 년 전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지금 병환 중에 계신 시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나면 한국에 가도 살갑게 맞아 줄 사람도 없다. 나 역시 자식들이 다 호주에 정착하고 있으니,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 일도 없다. 그런데 이번처럼 속 터지는 여권 사건을 겪으면서도 한국 여권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25년이 넘게 살면서도 어눌한 영어는 진전이 없는데, 한국어로 글을 쓰고 한국 드라마 보는 일에 더 열중한다. 주말이면 한국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배추를 사서 김치를 담는다. 밥상에는 늘 김치찌개, 된장찌개가 주요 메뉴이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교포들에게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부른다지만, 몸만 호주에 있을 뿐 한국에 사는 누구와도 다를 것이 없다. 호주에 살면서도 정작 호주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한국 뉴스에 더 집착하여 챙겨보고 있다. 한국의 변화되는 상황에 열을 올리는 내가 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나 어디에 살든 뿌리는 한국인이라는 생각에 자꾸 마음이 쓰이는 걸 어쩌랴. 이제 그만 시민권 신청을 하고 화를 돋우는 뉴스는 그만 보자고 마음먹지만, 여전히 한국 채널에 손이 간다.
아침에 일터에 출근하면 유튜브에서 음악을 골라 스피커에 연결하여 볼륨을 높인다.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할 때는 한국 노래 듣는 것으로 마음을 푼다. 내가 요즘 즐겨 듣는 노래는 영화 〈헤어질 결심〉의 주제곡이다. 청아한 정훈희의 목소리와 송창식의 낮은 목소리가 하모니를 이룬다. 연거푸 되풀이해서 노래에 빠져 듣고 있으면 어느새 우울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나도 따라서 노래를 흥얼거린다. 가게에서 물건을 고르던 손님이 노래가 좋다며 어느 나라 노래냐고 묻는다.
“응 좋지? 한국 노래야. 나는 코리안이야.”

김미경.1998년 호주 시드니로 이주. 현재 쇼핑센터 리테일숍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다. 2009년 《문학시대》 수필 등단. 2015년 수필집 『배틀한 맛을 위하여』. 공저로 2022년 수필U시간 동인 작품집 『바다 건너 당신』가 있다. 시드니 한인 문인들이 함께 하는 ‘문학동인 캥거루’ 회원이다.
* 사진제공_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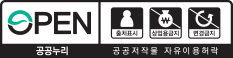
출처를 표시하시면 비상업적·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도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