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머의
새 글

3호
흐느끼는 사막 그림자 외 1편
장소현
흐느끼는 사막 그림자
타향살이 덧없이 길어지다 보면
문득
그림자의 그림자가 어른어른 보인다,
아주 가늘게 흐느끼며 떨고 있는
그림자의 그림자의 어른거리는 그림자의……
그림자는 젖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다고
사막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친구가 말했다,
마른 바람에 수줍게 흔들릴 뿐
젖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그림자의 그림자의 그림자……
그림자 때문에 갈기갈기 아파도
그저 밤 깊어 남몰래 떨릴 뿐
사막은 울지 않는다고 노래하던
그래서 술 마신다던 친구
지금은 없고, 멀리 가고 없고
그림자만 때때로 어른어른……
그림자의 그림자 몰래 흐느끼는
새벽 지나 아침 오면
그림자도 더이상 검지만은 않다.
검은색 안에 온갖 색 아롱아롱……
유달리 반갑게 나그네 맞이하는
무지개 사막 그림자
그 그림자의 그림자를 보았다,
수줍게 떨며 흐느끼고 있었다.
그 친구 멀리 가고 지금은 없고
타향살이 덧없이 길어지고
울음 삼키는 사막
점점 흐릿해지는 무지개 그림자
그림자의 그림자의 어른거리는 그림자의……
노래인지 비명인지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괴물을 만들어낸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경배하기로 한다.
창조주의 유장한 흐름, 그 도도한 흐름을
쪼개고 잘라 토막토막 낸 그 겁 없는
칼질을 일단 찬양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 토막을 숫자로 친절하게 계산해
나란히 줄 세우는 기계를 발명한
손을 일단 존경하기로 한다.
그 투명한 감옥을 시간이라고 우러르며
우리는 살아간다. 째깍째깍…… 똑딱똑딱
노래인지 비명인지 도무지 모를 소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타향의 시간과
바다 건너 고향의 시간은 달라
여기가 밤이면 거기는 낮
깊은 밤 문득 잠 깨어, 지금 몇 시나 되었을까…… 캄캄한 허공에 또렷하게 부릅뜬 4:44……
소스라쳐 놀라 식은땀 흐르고…… 이제 곧 닥치겠네, 5:16, 6:25, 8:15, 9:11, 10:26, 10:29, 12:25……
날마다 두 차례씩 어김없이 나타나 잠시 반짝이다가 힘없이 슬그머니 사라져버리는 흔적. 우리가 역사라고 거창하게 부르는 바로 그것.
시간은 뒷걸음질을 모른다.
오로지 묵묵히 앞으로 앞으로……
사막 땅 타향살이도 그렇다, 묵묵히 앞으로만
째깍째깍…… 똑딱똑딱
노래인지 비명인지 모를 소리.
시계라는 괴물이 차갑게 불러내는 역사 나침반, 빛바랜 숫자들, 화석처럼 딱딱해진 무심한 숫자들.
시계 안에서 우리 아픈 현대사 날마다 두 번씩 어김없이 들쑤셔지는데, 우리는 그저 못 본 척 나그네처럼 터벅터벅
죽음 향해 걸어가며 군시렁군시렁……
어제 오늘 내일
과거 현재 미래
요새 시계는 아무 소리도 없이 잘도 가지만, 옛날 시계는 쉬지 않고 재잘재잘 째깍거렸지. 옛날 시계는 밥 먹고 느긋하게 째깍째깍 가다가 힘들거나 심심하면 천천히 느릿느릿 급하면 겅중겅중 배고프면 엉금엉금 밥 달라고 멈춰 서고 아예 죽어버리기도 하고……
바늘 셋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영차영차 시간을 밀고 가는데……
서두를 것 별로 없던 시절에는 네 시간 내 시간 조금 다르고 엇갈려도 그저 그러려니 웃어넘기곤 했지만
요새 시계는 한 치 에누리도 없이 차디찬 숫자로 시방 몇 시 몇 분 몇 초라고 매정하게 날 휘감아 옥조이니
자주 무섭다, 아주 자주 무섭다.
값비싼 시계는 금빛으로 번쩍번쩍
큼직한 붕알 만고강산 오락가락
요새 시계는 매몰찬 숫자로
째깍째깍…… 똑딱똑딱
노래인지 비명인지 모를 소리.
정겨운 옛날 시계나 매정한 요새 시계나 하루 두 번씩 역사는 왔다 가고, 우리는 그저 죽음 향해 터벅터벅……
째깍째깍 터벅터벅 째깍째깍 터벅터벅……
때로는 아주 가끔은 아주 잠깐이라도
역사의 무게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건 결국
흘러가지 못하고 남은
쓰레기 찌꺼기
그래서
모든 역사에서는 썩은 비린내가 난다.
시간은 뒤로 가지 않는다.
뒤로 갈 줄 모른다.
째깍째깍 터벅터벅 째깍째깍 터벅터벅……
명랑한 노래인지 단말마 비명인지 모를 소리.
시(時)는 절간(寺)의 해(日)
뜨고 지는 절의 해
그러니 토막 난 흐름일 수 없다.
그침 없이 이어져 흘러갈 따름……
째깍째깍 터벅터벅 째깍째깍 터벅터벅……
고향과 여기는 시간이 달라.
시간이라는 것이 없다면 나도 나이를 먹지 않았을 테지. 시간이 없다면, 내 나이는 지금 얼마나 되는 걸까? 쉬지 않고 늙어가는 내 나이는?
시간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여
허허벌판에 홀로 서서
이제부터라도
창조주의 유장한 흐름, 도도한 흐름을
쪼개고 토막토막 잘라낸 그 겁 없는
칼질을 찬양하기로 한다.
너무나도 친절한 시계를 발명한
손을 존경하기로 한다.
째깍째깍 터벅터벅 째깍째깍 터벅터벅……
즐거운 노래인지 아픈 비명인지 모를 소리.
시간은 뒷걸음질을 모른다.
우리네 인생살이처럼
오로지 앞으로 묵묵히 앞으로……
인간은 시계가 정해준 시간에
일하고 놀고 먹고 자고 하는 허튼 목숨이 아니다.
스스로 그러하게(自然)
놀고 싶을 때 놀고 졸릴 때 자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다.
모모네처럼
남아돌아가는 시간 저축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은행이라도 만들자.
째깍째깍 터벅터벅 째깍째깍 터벅터벅……
노래인지 비명인지 모를 소리 시끄러운,
흩어지는 먼지를 나이라고 부르고
역사라고 우러르는 우리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타향의 시간과
태평양 너머 고향의 시간은 달라
여기가 밤이면 거기는 낮
째깍째깍 터벅터벅 째깍째깍 터벅터벅……
노래인지 비명인지 모를 소리.

장소현. 시인, 극작가, 언론인, 미술평론가 등으로 활동하는 자칭 ‘문화잡화상’으로, 이런저런 글을 써서 여기저기에 발표하고 있다. 서울대 미대와 일본 와세다대학 대학원 문학부를 졸업했다. 『서울시 나성구』, 『널문리 또랑광대』 등 8권의 시집과 희곡집, 소설집, 칼럼집, 미술책 등 27권의 책을 펴냈고, 「서울말뚝이」, 「김치국씨 환장하다」, 「민들레 아리랑」 등 50편의 희곡을 한국과 미국에서 공연, 발표했다. 고원문학상, 미주가톨릭문학상을 수상했다.
* 사진제공_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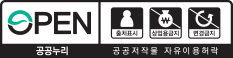
출처를 표시하시면 비상업적·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도 금지됩니다.